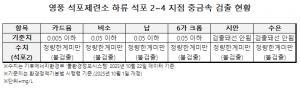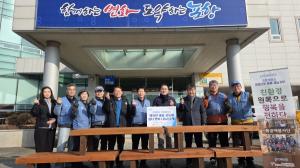“그림 속에 남은 약속, 500년 만에 돌아오다”…포스코미술관 채운 조선서화
포스코미술관이 잊혀진 조선 미술사의 한 장을 새롭게 펼쳤다.
8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서울 포스코센터 포스코미술관에서 열리는 기획전 ‘The Hidden Chapter – 오백 년 만에 돌아온 조선서화’는 일본 교토의 고미술품점 이조당(李朝堂)을 운영하며 40여 년간 한국 고미술을 수집한 이리에 다케오(入江毅夫)의 ‘유현재(幽玄齋)’ 컬렉션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포스코미술관은 조선 초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산수화, 인물·풍속화, 화조·영모화, 궁중화, 불화, 서예 등 50여 점이 선보인다. 특히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했던 화원들의 귀중한 회화작품도 포함돼 역사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8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기획전 ‘The Hidden Chapter – 오백 년 만에 돌아온 조선서화’는 일본 교토의 고미술품점 이조당(李朝堂)을 운영하며 40여 년간 한국 고미술을 수집한 이리에 다케오(入江毅夫)의 ‘유현재(幽玄齋)’ 컬렉션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8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기획전 ‘The Hidden Chapter – 오백 년 만에 돌아온 조선서화’는 일본 교토의 고미술품점 이조당(李朝堂)을 운영하며 40여 년간 한국 고미술을 수집한 이리에 다케오(入江毅夫)의 ‘유현재(幽玄齋)’ 컬렉션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유현재(幽玄齋)’는 이리에 다케오가 자신의 자택에 붙인 당호로, 그는 조선과 일본의 문화 교류 속에서 전해진 화원, 문인, 통신사 등 다양한 계층의 글씨와 그림을 모았다. 1996년에는 730여 점을 수록한 ‘유현재선 한국 고서화도록’을 발간해 한국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작품 실물은 일본에만 머물러 있었고, 한국 연구자들은 책 속 사진으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듬해 재일교포 수장가 나카무라(中村)에게 넘어갔던 유현재 컬렉션은 그의 사망 이후 시장에 풀렸고, 국내 민간 컬렉터의 손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번 전시는 그 귀환의 결실이다.
전시장 초입에는 조선 전기 희귀작인 하관계회도(下官契會圖)가 걸려 있다. 관원들의 모임을 기념해 남긴 일종의 단체 기록화로, 인물 묘사는 작게 처리한 반면 산수는 크게 묘사해 안견풍의 이상적 산수 전통을 보여준다. 포스코미술관 관계자는 “계회도는 오늘날로 치면 단체사진 같은 개념”이라며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자 회화”라고 설명했다. 말미에 ‘아애(啞崖)’라는 호가 확인되면서 병조 관료 이산과 연결되고, 제작 시기가 16세기 중반으로 특정됐다.
 하관계회도.
하관계회도.조선통신사 교류 속에서 일본에 건너갔던 작품도 함께 전시됐다. 김명국의 달마도는 술에 취한 듯한 과감한 필치와 간결한 여백으로 당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김명국은 통신사에 두 차례 동행했으며, 김의신과 함께 남긴 합첩에는 그림과 글씨가 함께 실려 있어 1643년 사행 당시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외교와 예술이 맞닿은 기록물이다. “당시 일본인들이 줄을 서서라도 갖고 싶어 했던 그림”이라는 도슨트의 해설은, 작품의 위상을 실감케 한다.
 연담 김명국의 달마도.
연담 김명국의 달마도.작자 미상의 목마도 8폭 병풍은 조선시대 말 그림 가운데 보기 드문 대작으로, 수십 필의 말이 뛰노는 장면이 국가의 번성과 발전을 상징한다. 윤두서 가문의 화맥과 연관성이 제기됐지만 확증이 없어 현재는 작자 미상으로 전시된다.
긍재 김득신의 송하호도와 해암응일도는 호랑이와 매를 짝지어 그린 대련 작품으로, 호랑이 머리에 표범 무늬가 섞여 있는 모습은 조선 후기 특유의 화풍을 드러낸다.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표정은 벽사의 의미와 함께 민속적 친근함을 전한다.
 목마도 8폭병풍.
목마도 8폭병풍.단원 김홍도의 평생도 6폭 병풍은 돌잔치, 혼례, 출세, 장수까지 이상적 일생의 여정을 담았다. 종로 종각과 영통교 등 실제 지명이 확인돼 풍속화이자 기록화로서 가치가 있으며, 양반가에서 이상적 삶을 기원하며 곁에 두었던 그림으로 해석된다.
조선 후기 진경산수의 흐름을 보여주는 영남명승도 병풍은 지리산과 낙동강 등 영남의 명소를 사실적으로 담아 ‘지도 같은 산수화’로 평가된다. 제작 시기는 1757년에서 1767년으로 추정됐다.
 단원 김홍도의 평생도 6폭병풍.
단원 김홍도의 평생도 6폭병풍.가문의 역사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작품도 있다. 의령 남씨 가문 화첩은 왕세자 교육 연회, 경로잔치, 문무대회 참여 장면을 기록했으며, 흰말과 갈색말을 끌고 가는 모습은 당시 상을 받은 정황을 보여준다. 그림과 글을 통해 참여자 명단까지 확인할 수 있어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전시 말미에는 조선 후기 불화와 근대 화가들의 산수화가 걸렸다. 불화는 법당의 설법 장면과 민간 신앙이 어우러진 산신도를 담고 있으며, 근대의 청전 이상범 산수화는 전기의 이상적 산수와 후기의 진경산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작품으로 소개된다.
한편, 이번 전시는 단순한 고미술 공개가 아니라 문화 교류 속에 일본으로 건너갔던 작품들이 다시 돌아와 한국 미술사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계와 대중 모두에게 조선 서화의 새로운 장을 펼쳐준 자리이자, 포스코미술관이 산업도시 한복판에서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이야드 고객센터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